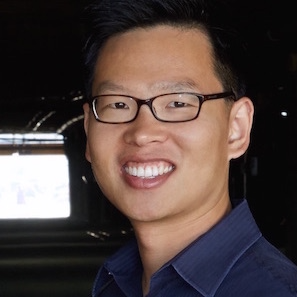Mujin
무진기행
오랜만에 딴지 일보에 들어갔다가 김승옥의 ‘무진기행’의 배경이 순천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스크랩이 안됨에도 너무 반가운 나머지 부득이 전문을 옮겨왔다.
무진과 순천이라, 그러고보니 왠지 닮아있다는 느낌도 1g 정도 드는 듯…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결국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나 오늘은 잠시 그 소망을 접자. 불행하게도 현실은,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 한 사르트르 쪽에 더 많이 가깝다.
하기야 인생이 언제 외줄놀이를 하던가? 병과 약을 동시에 주는 게 인생일지니, 사람과 사랑이 때로 희망이다가 지옥일 수도 있겠다. 다만, 행복의 달콤함 보다는 고통의 생채기가 더 오래, 지독히도 오래 남는다는 것이, 우리가 자주 사르트르에 동감하는 이유 일 테다.
게다가 나이를 먹으면서는 더 지옥이다. 늙어간다는 것은 상처에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거꾸로 상처에의 기억력은 발달한다는 뜻이다.
사르트르 말대로 사람이 흔들고 관계가 지치게 한다. 나도 모르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미 규정화된 체 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이면서도 열 명, 스무 명이다. 또 다른 나는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술자리에 초대되어, 말 한 마디 못한 채 그들의 날 선 공격과 비아냥을 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게 되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과만 어울리게 되며, 모르는 사람을 향한 경계심은 시나브로 커져만 간다.
그런데 나는 늘 피해자인가? 그건 분명 아니다. 저들이 그러했듯, 나도 무심하게 타인을 내 맘대로 복제시켜 술안주 했다. 나의 무책임과 나의 방만함과 나의 이기심이,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게 되어 어느 한 밤 그를 잠 못 들게 했다는 것을, 나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한국의 소설가 김승옥은 1960년대에 그의 소설 ‘무진기행’에서 사르트르보다 더 구체적인 말을 했다.
” 어떤 사람을 잘 안다는 것- 잘 아는 체한다는 것이 그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무척 불행한 일이다. 우리가 비난할 수 있고 적어도 평가하려고 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명이 크다. 나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거꾸로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말. 내가 그를 신뢰해서 속내를 다 드러낸 고백이, 어느 날 독화살로 변할 수 있다는, 그리고 나도 내 아는 이에게 그럴 수 있다는.
이 쯤되면 진정, 나를 포함한 타인은 지옥이다.
스스로 속물이 되어간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가? 계산에 민감하고, 달면 삼켰다가 쓰면 금방 뱉어버리고, 세속의 부와 명예에 탐닉하며, 계급적 권위로 상대를 제압하려 하는 자신을 볼 때?
아니다. 인간의 사악함은 바로 그런 회의가 들기 바로 직전, 제 행동의 합리화를 명령내린다. 편하게 살아 짜샤, 다 그렇게 사는거야..라고.
오히려, 스스로 속물이 되어간다는 것을 느끼는 때는,
타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나 스스로 경멸의 눈빛을 보낼 때이다. 자꾸 살면서 속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느끼며 토악질의 횟수가 많아질 때, 그 때 우리는 의심해야 한다. 남의 허물을 안다는 건, 내가 그 허물에 이미 오염되었다는 뜻이다. 친숙한 거울 들여다 보기.
김승옥의 단편소설 무진기행은 또 다른 우리들의 거울이다.
무진기행에는 윤희중과 하인숙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윤희중은 정신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전쟁 때 징병을 피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강압에 골방 안에서 수음이나 하며 친구의 전사 소식을 들었던 젊은 날. 그런 자신을 향한 모멸과 오욕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상처다. 부잣집 딸과 결혼하여 사회적 성공을 성취하고 다시 자신의 고향 무진으로 내려와 벌어지는 일련의 속물적 과정이 이 소설의 얼개를 이룬다.
무진에서 만나는 하인숙이라는 여자는 노골적으로 통속적인 여자다. 오페라 ‘어떤 개인날’을 좋아한다는 그녀가 이제는 화투짝이 흩어진 방에서 ‘목포의 눈물’을 부른다. 거의 신파조에 가까운 윤희중과 하인숙의 대화는 통속의 절정이다. 그리고 작가가 구현하는 유쾌한 필체의 정점이다. 60년대 어떻게 이런 감성의 작가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여하튼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다가도 가슴 한쪽으로 슬그머니 찾아오는 그 어떤 서글픔을 경험한다. 내밀한 자신의 속내, 그 추잡스러움을 들켜 버린 듯한 당혹감과 함께. 홍상수가 발견한 생활이 무진에도 있다.
서울로 데려가 달라는 하인숙에게 그러마 하고 약속을 하면서도 윤희중은 알고 있다. 무진을 떠나는 날 그녀를 잊어버리리라는 것을. 윤희중에게는 너무나 잘 학습 된 연애에의 속물근성, 그러면서도 그는 너무나 진지하고 그 무의미한 진지함에 몸을 맡겨버린다. 자의식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어져 버린다. 이곳은 무진 이니까.
주인공에게 무진은 그런 곳이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는 곳이 무진 이며 무언가 새출발이 필요할 때면 힘을 불어주는 곳이 무진 이다. 그러나 그 힘이라는 것은 추친력이나 의지와는 다르다. 자의식에의 해방. 스스로를 옥죄던 타인과 자신에의 속물근성을, 참을 수 있을 만큼 가볍게 만들기. 사람은 무위(無爲)이며 사는 건 장난이라고 느껴보기. 그것이 무진이 주는 힘이다.
털털.
새털처럼 가벼워진 소우주의 환희.
무진은 타인이라는 지옥을 피해 떠나는 여행지가 아니다. 오히려 무진 자체가 지옥이다. 다만, 희망과 사랑의 강박을 벗어던지고 연옥 속에서 연꽃처럼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무진인 것이다. 소설속 무진은 그런 곳이다.
그런데 대체 무진이 어디일까? 바로 순천이다. 작가 김승옥 스스로 밝힌 대로, 무진이라고 이름 붙여진 소설 속 마을은, 비록 지도에는 표시되어있지 않지만 순천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
순천 상사호의 일몰
소설 속에서는 이 도시의 특산물에 대한 언급이 있다. 무진의 특산물이란 바로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과 같은, 안개다.
“무 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 내놓은 입김과 같고..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라고 쓰여진 그 안개이다.
실제 순천에서 우리는 저 소설의 무대를 실감나게 만나볼 수 있다.
순천 대대포 갈대 밭
순천만 대대포 갯벌의 갈대밭은 아침에 내리는 안개로 인해 더욱더 몽환적인 분위기를 뿜어낸다. 그 갈대밭은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어느 때고 순천을 찾는 이의 마음에 보석의 추억을 뿌려준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어서 더 애착이 가는 낙안읍성을 둘러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다.
그러나 정작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찾아온 여행자에게 있어 순천 여행의 정점은 역시 선암사이다. 그 유명한 똥간을 포함해 버림에의 미학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찰이자, 채움에의 완성도를 가장 훌륭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 사찰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곳이 바로 선암사이다. 희망과 절망이 늘 교차하는 우리네 교묘한 인생을 보는 듯하다. 조계산 등산 코스를 이용해 만나게 되는 송광사 역시 놓치기에는 아까운 사찰이다.
선암사 승선교
사는 것이 온통 버겁고 진지하며 그 진지함에 스스로 가위눌려 신음할 때, 관계 속에서 배신으로 인해 가슴이 타들어갈 때, 내가 점점 속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릿저릿 느낄 때, 우리는 소설 속 주인공처럼 무진, 아니 순천을 갈 자격이 주어진다. 그곳에는 햇빛의 신선한 밝음과 살갗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가 있을지니 불면으로 고생한 우리를 푹, 아주 푹 숙면케 하리라.
무위의 안개에 영혼을 내 맡겼던 그 여행의 끝, 도시로 귀환하는 버스 안에서 여전히 잠에 빠져 있는 당신은 길가에 이렇게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볼지 모른다.
” 새털처럼 가벼워진 당신은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는 거, 그거 별 거 아닙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순천 여행 정보
(관광지) 대대포 갯벌 (관광지) 낙안 읍성 (관광지) 선암사 (맛집) 대대선창집 (맛집) 고향보리밥 (숙소) 앰버서더 호텔